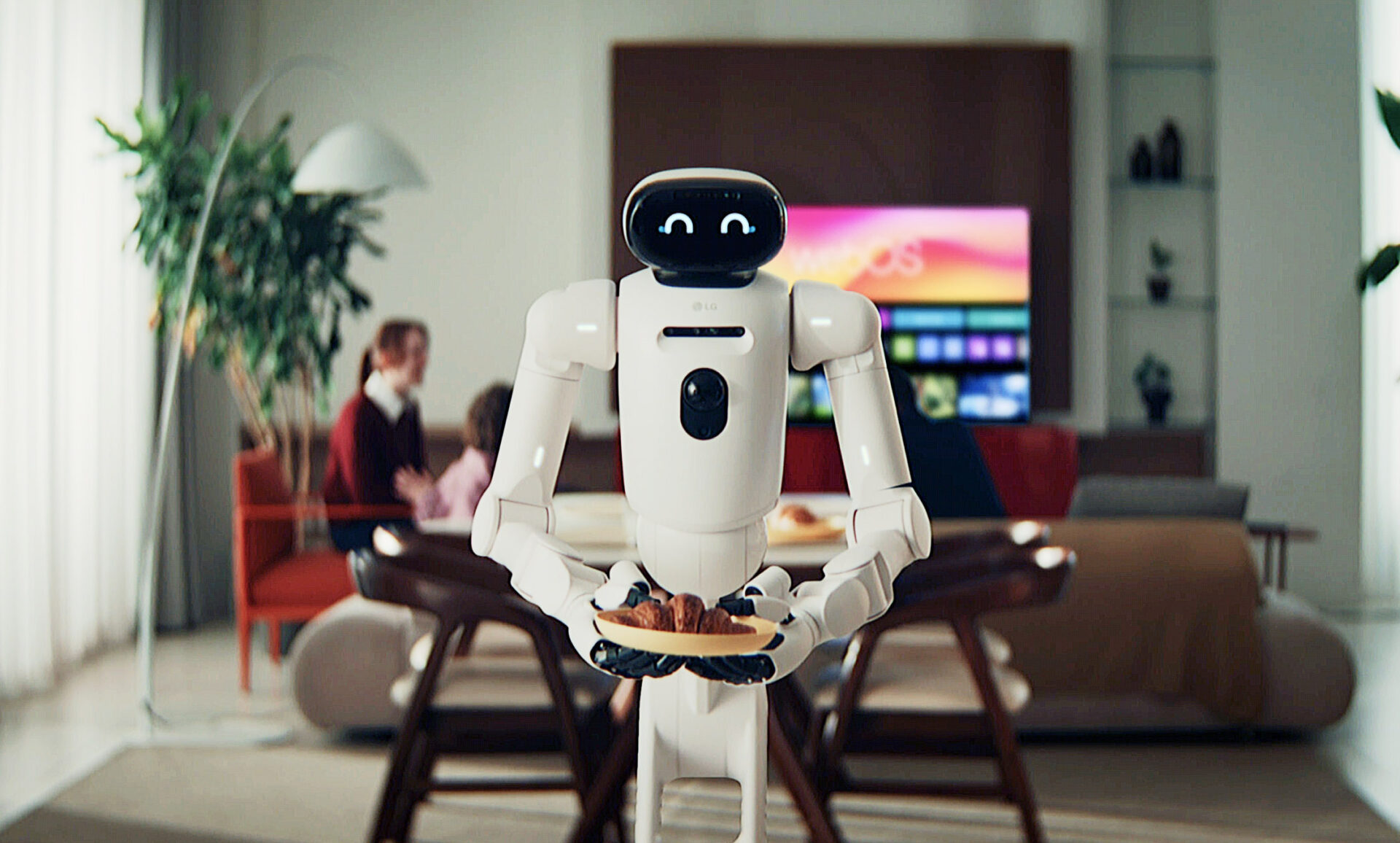intro

스마트 워치를 사용한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고백하자면 애플 워치는 내 39년 인생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해본 유일한 시계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는 역사가 깊고, 만듦새가 훌륭하며, 반짝이는 사치품에 쉽게 홀리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유독 시계에 대해서만은 지독한 실용주의자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종일 타이핑을 하는 직업이다보니 손목이나 손가락에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영 거슬린다. 팔찌나 반지도 착용해본 일이 없다. 이런 내가 시계를 사기 위해선 단순히 근사하거나 시간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쓸모가 필요했다.
2014년 9월 9일, 애플이 아이폰6 시리즈와 애플페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One More Thing이 나왔다. 박수가 쏟아졌고, 팀 쿡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 기대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새로운 제품”이라고. 애플 워치를 설명하는 완벽한 문장이었다. 그때 결심했다. 내 인생 첫 시계를 사기로.
물론 애플 워치의 데뷔는 순조롭지 않았다. 혹평이 쏟아졌다. 형태가 네모난 것은 시계가 아니다.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것은 시계가 아니다. 시계는 시계 브랜드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혹평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애초에 ‘시계’라는 물건에 기대하는 바가 달랐으니까.
애플 워치와 친해지는 과정은 짜릿했다. 전화나 알림이 올때마다 피부에 부드럽게 진동이 퍼지는 느낌이 좋았다. 바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땐, 손바닥을 화면 위에 가볍게 포개어 놓으면 진동이 멎었다. 정신 없는 촬영장에서 “내 아이폰이 어딨지?”하고 종종 거리며 찾아다닐 필요 없이, 간단한 메시지는 애플 워치로 답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좋았다. 물론 1세대 제품에서는 내가 말한 기능들이 아주 매끄럽게 구동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2023년이니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기기라는 사실은 곧, 한계없는 ‘커스텀’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애플 워치의 화면은 디자인에 따라 여러 개의 ‘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출장지에서는 한국 시간과 현지 시간을 동시에 띄워둘 수 있고, 강수량이나, 일몰, 오늘 활동량, 다음 스케줄같은 정보를 입맛에 맞게 배치할 수도 있다. 물론 분침과 초침만 남겨둔 심플한 디자인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내가 사랑하는 스누피 캐릭터가 그려진 워치페이스를 애용한다. 기분이나 스케줄에 따라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줄질’ 역시 애플 워치를 사용하는 기쁨 중 하나다. 손끝으로 잠금 장치를 눌러 쉽게 밴드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은 정말이지 센세이션했다. 게다가 애플 워치 자체는 매년 신제품이 나와 갈아치우고 있지만, 2015년에 구입한 밴드도 2023년에 나온 워치와 여전히 호환이 된다. 운동할 때 차기 좋은 실리콘 밴드부터 에르메스 로고가 붙은 가죽 밴드, 섬유를 섬세하게 엮어 만든 나일론 밴드까지 수십 개의 디자인을 모았다.
사실은 애플 워치에 대해서라면 덕후처럼 끝없이 떠들어댈 수 있을 만큼 할 말이 많다. 넘어짐 감지 기능이나 충돌 감지같은 기능이 먼 나라에 사는 누군가의 삶을 구했더라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플 워치가 9년에 걸쳐 내 인생에서 바꾼 사소한 변화를 언급하고 싶다. 나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학창 시절엔 출석만 해도 점수를 받는다는 체육 과목에서 ‘전교 꼴등’을 했다. 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의 취미 같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거북하고 두려웠다. 그런데 애플 워치의 기능을 뽕 뽑겠다고 9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근력 운동을 했고, 스피닝에 빠지기도 하고, 요가도 해보고, 등산도 하고, 골프도 쳤다. 주기적인 게으름으로 텀이 벌어지거나 장르가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했다. 매일 애플 워치 화면에 있는 ‘활동량 목표’를 채우는 게 즐거웠다. 목표를 채우면 받을 수 있는 배지나, 친구들과 활동량을 겨룰 수 있는 기능이 경쟁심을 자극했다. 이런 과정이 9년 동안 켜켜이 쌓여 나는 대단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스마트 워치가 내 손목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까르띠에의 고전적인 디자인이 갖고 싶어 쇼윈도 앞에서 한참 바라본 적도 있다. 영롱하더라. 열심히 물장구치며 나아가는 내 삶을 위한 선물이라고 합리화하면 못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갑을 열 만큼 구체적인 물욕이 생기지 않았다. 눈은 동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까르띠에보다 애플 워치라니. 이 합리적인 편리함 안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걸. 오만하게도 나는 평생 여러분이 말하는 ‘진짜 시계’는 사지 않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다.
About Author
하경화
에디터H. 10년차 테크 리뷰어. 시간이 나면 돈을 쓰거나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