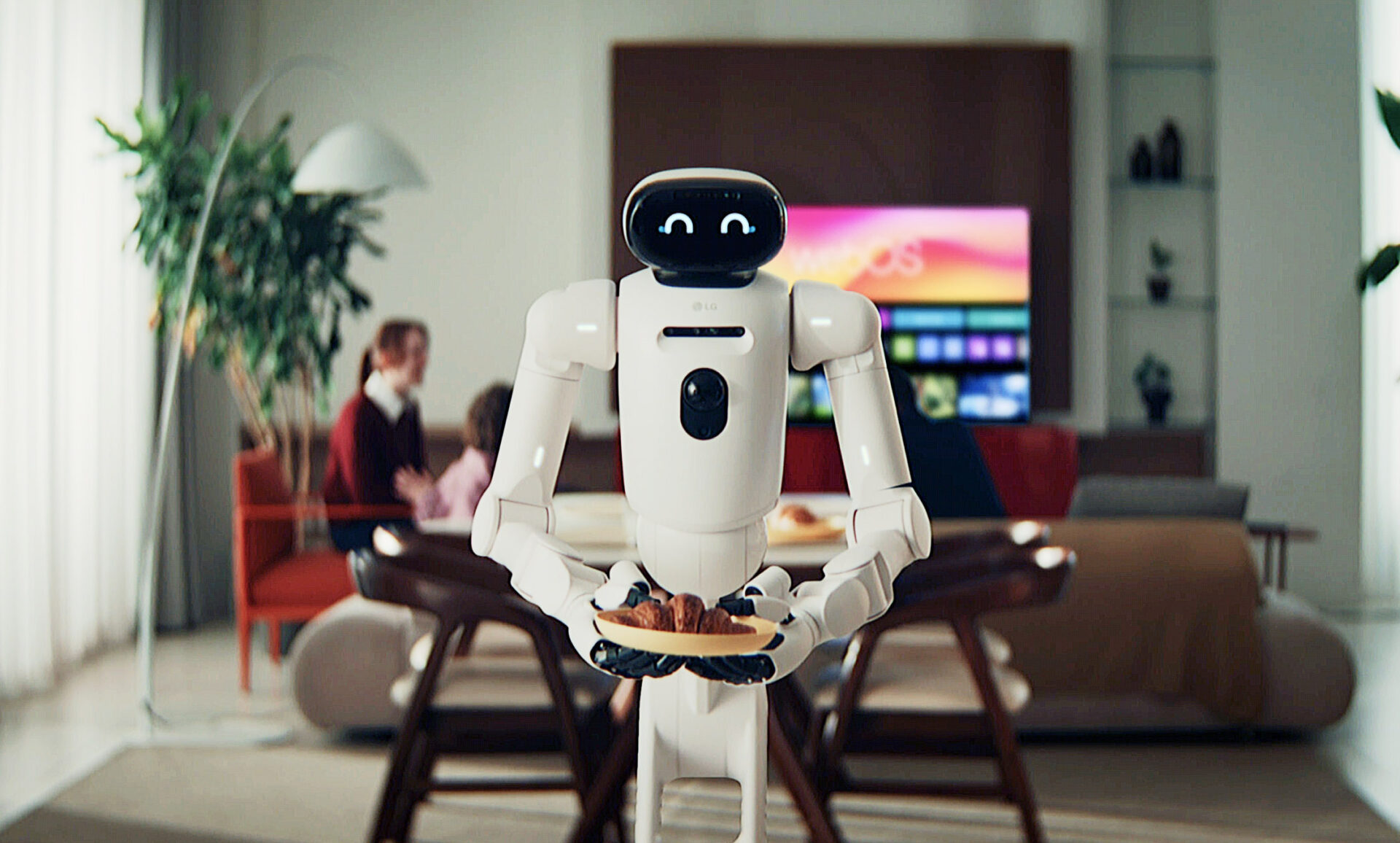“나는 쓰는 사람이다.”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가계부도 쓰고 글도 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새로운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전에 M2 맥북 에어 15인치 미드나이트 컬러를 구입했다. 175만 원을 썼다. 몇 번째 맥북이더라? 잘 모르겠다. 지금 미드나이트 컬러 M2 맥북 에어에 지문을 잔뜩 묻혀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1995년부터 자유기고가 일을 시작했으니 대략 28년 동안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썼을까? 그동안 내 이름으로 된 에세이 여덟 권, 공저 네 권, 소설책 열두 권을 출간했다. 책으로 묶지 않은 글과 일기와 메모와 편지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을 썼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가끔은 뇌가 손가락에 달린 것 같기도 하다. 대부분의 글을 (다양한 버전의) 맥북과 아이패드로 썼다. 문학 청년일 때는, 그러니까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는 조립 PC와 (빨콩이 달린) 씽크패드와 소니 바이오 등을 사용했는데, 소설가가 된 이후에는 주로 맥북을 사용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 맥북이 출시된 시기는 2006년, 내가 첫 책 <펭귄뉴스>를 출간한 것도 2006년. 맥북의 역사가 곧 내 소설의 역사가 되었다.
대학이나 도서관에 글쓰기 강의를 하러 가면 농담삼아 이런 조언을 해주곤 했다.
“글쓰기는 절대 맥북으로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역시 맥에는 제대로 된 한글 프로그램이 없나 보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조금 뜸을 들인 다음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맥북의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가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의 글이 몹시 잘 쓴 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디스플레이 성능이 떨어지는 노트북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맥북 디스플레이 홍보 카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농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 들어 있는 말이다. 글을 쓰다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다. 내가 방금 쓴 글의 내용은 너무나 비루한데, 그 글이 아로새겨진 화면은 몹시 아름답다. 그 괴리가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 저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야 할 텐데… 500nits보다 밝은 글을 써서 사람들을 환하게 웃도록 해야 할 텐데, 60Hz 주사율에 버금가는 생생하고 선명한 묘사로 화면을 가득 채워야 할 텐데… 나는 방금 썼던 비루한 문장을 지우고, 좀 더 나은 문장을 쓰기 위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더욱 선명한 화면의 M2 맥북 에어를 구입했다. 새 기계를 사면 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마음을 다잡아본다.
오랫동안 글쓰기에 매진한 작가들은 자신의 글이 맥북의 성능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덕분에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만, 초보 작가들은 화면의 아름다움에 현혹돼 자신의 글이 그만큼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조금 고쳐 말하면, 초보 작가들은 절대 맥북으로 글을 쓰지 말길 바란다. 아니다, 농담이다. 초보 작가들이야말로 맥북으로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랬다저랬다 해서 미안하다. 애플이야말로 초보 창작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다.
맥은 창작자를 응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멋진 광고를 내놓는다. 수많은 명작들이 있지만 2013년 광고 ‘Misunderstood’는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소심해 보이는 한 아이가 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놀 때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폰만 만지작거린다. 게임을 하는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알 수 없다. 가족들은 한참 후에야 아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아이는 그동안 관찰하면서 촬영한 결과물을 편집한 후에 가족들에게 상영한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괴로운 시간을 견뎌낼 때 예술가는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본다. 조용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왜 혼자 떨어져 있냐,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듣지만, 예술가는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즐기면서 자신의 결과물을 다듬어 나간다. 애플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위로를 건넨다. ‘혼자만의 창작을 즐겨요, 애플 제품으로. 그렇지만 당신의 작품을 함께 나눈다면 오해도 줄일 수 있고, 함께 즐거워질 거예요. 함께 나눌 때도 애플 제품으로.’ 광고를 보고 나면 기꺼이 애플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진다.
맥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모든 시스템이 창작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 때문이다. 조립PC를 좋아한 적도 있고, 컴퓨터 부품 매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맥을 쓰고부터는 그런 취미가 사라졌다. 도스, 리눅스, 윈도우 설치에 비해 맥의 OS 설치는 식은 죽 먹기다. 게다가 무료다. 한번 적응하기만 하면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도 무척 쉽다. 모든 화면이 직관적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게 만들어져 있다.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런 일에 시간 낭비 마시고 빨리 글을 쓰세요.
아니면 다른 걸 창작하든가.”
물론 이런 단서가 뒤에 더 붙는다.
“대신 가격은 좀 비싸요. 애플도 먹고 살아야죠.”
나는 기꺼이 돈을 쓴다. 맥북을 사고, 아이패드를 산다. 개러지밴드로 음악을 만들어보고, 아이무비로 영상 편집도 해본다. 어설프게라도 뭔가 만들어 보게 되고, 만든 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서투르게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G. K. 체스터튼의 말이다.
맥으로만 작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윈도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쯤은 윈도우의 편의성이 맥을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설치도 간편해지고 업데이트도 손쉽게 될지 모른다. 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한입 깨문 사과 모양의 로고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과 로고는 사용자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글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마주하면, 사과는 뒤집힌 상태다. 노트북을 펼치면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 눈에만 보인다. 왜 사과는 뒤집힌 상태일까?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제대로 보이도록 해놓은 것일까? 애플은 뒤집힌 로고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혼자 하는 예술도 무척 좋지만, 만약 뭔가 만들었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어떨까?’ 예전 맥북에는 그런 이야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로고에 불이 들어오기까지 했다. 애플 로고를 볼 때마다 내가 쓰고 있는 글의 의미를 생각한다. 노트북을 닫으면 사과는 뒤집혀져 있다.
About Author
김중혁
소설가. Pages, Obsidian, Ulysses, Scrivener 어플을 사용하고 Nuphy 키보드로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