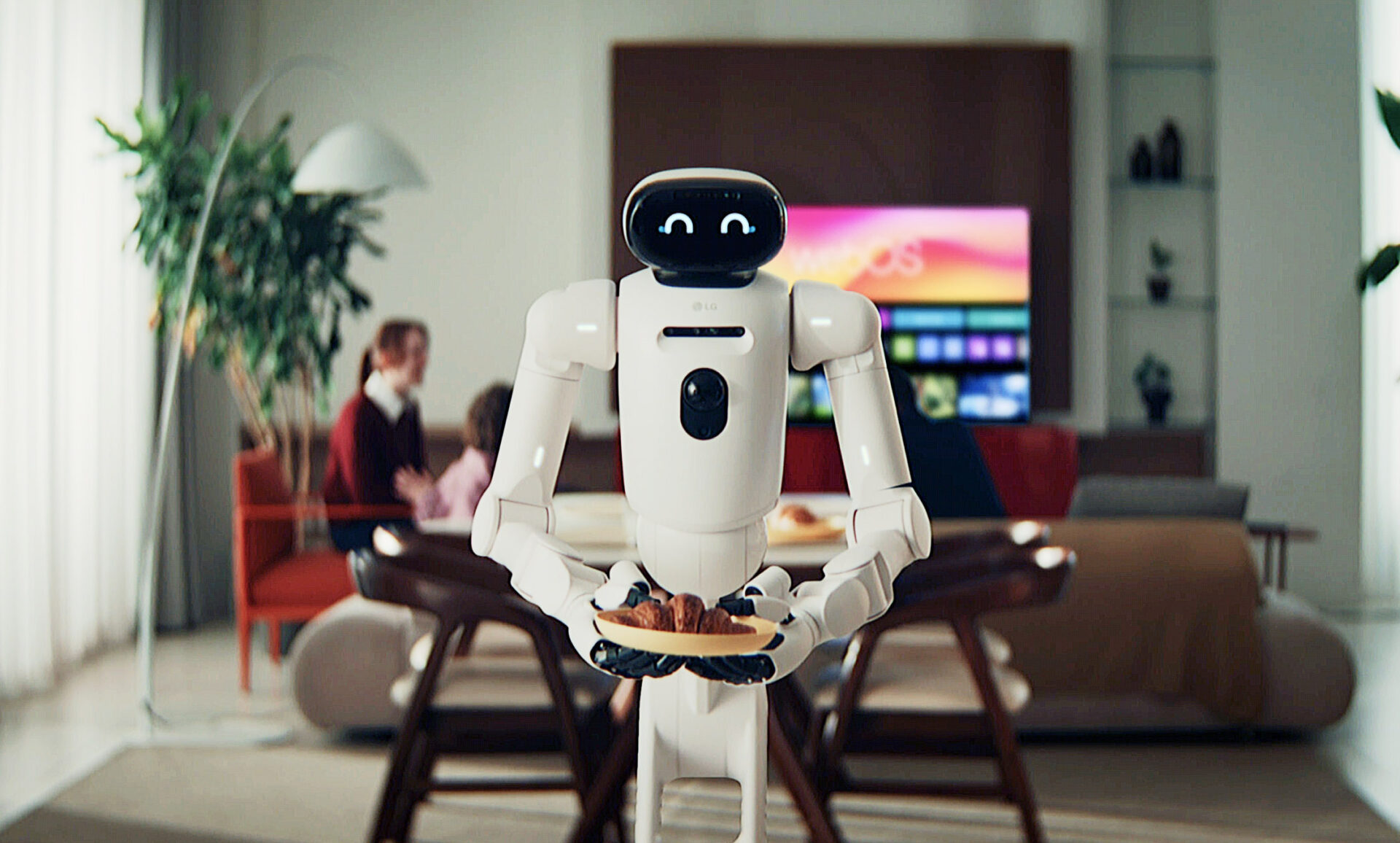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최호섭입니다.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마냥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새 기기들은 접는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처음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접는 스마트폰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보여주었습니다.
기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접는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갤럭시 폴드를 비롯해 모토로라나 화웨이 등 많은 기업들이 처음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접어야 할까?’였습니다. 화면을 접는 일은 그 자체로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 내구성이나 제품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가격과 연결되고, 갤럭시 폴드는 비싼 스마트폰 위에 ‘아주 비싼 스마트폰’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칫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쯤 전, OLED의 특성을 이용해 접거나 구부리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오랜 노력을 통해서 진짜 마술처럼 휘어지는 화면을 내놓았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얼마나 신기한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에 딱 어울려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OLED에 강점을 가진 LG는 화면을 말아 넣는 롤러블 TV를 내놓았고, 소형 OLED에 강한 삼성은 접는 스마트폰을 꺼내 놓았지요. 두 제품 모두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완성도 역시 훌륭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휘는 화면을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휘는 화면을 만들어 놓고 그게 쓰일 제품을 개발한 것인지는 아직도 조금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그리고 플립은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접는다는 기술과, 그 접는 경험이 상품성으로 이어진다는 답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세대는 진지하게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신기함이 주인공이었고, 두 번째 세대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더해진 진화에 의미가 있다면 세 번째는 ‘상품성’에 의미가 있어야 하지요. 접는 화면에 대한 이유가 대중적인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왜 접어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화면은 더 넓으면서 크기는 작은 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지요. 상식적으로 작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화면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큰 화면을 쓰려면 태블릿을 쓰는 게 맞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기기들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길 바랐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기 앞면에서 화면을 크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버튼까지 사라진 전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18:9처럼 더 긴 화면도 그 욕심을 채워주었지요. 그리고 이를 가장 제대로 흡수한 것이 접는 화면입니다.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것이지요.
삼성전자는 그 포인트를 꽤 잘 잡았습니다. 접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갤럭시 플립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토로라가 나옵니다.
모토로라는 1996년 스타택이라는 휴대전화를 내놓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모토로라는 마이크로택이라는 브랜드의 휴대전화로 대박을 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던(아마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무선전화기의 디자인을 본따서 만든 것이지요. 마이크로택은 ‘벽돌’로 불리던 커다란 휴대전화를 반도체 기술로 줄여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스타택은 완전히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 자체로도 아주 작았는데 펼치면 기존 휴대전화만큼 길어져서 편안하게 통화를 할 수 있었지요. ‘아니! 휴대전화가 접히다니!’ 당시의 스타택은 충격이었고, 실제로 그걸 손에 넣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콘셉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금도 스타택을 열 때의 그 ‘딸깍’하는 소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택은 접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휴대’라는 휴대폰의 기본적인 조건을 극대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거나 뒷주머니에 툭 튀어나오게 꽂아서 ‘멋’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타택은 셔츠의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그 광고도 전화기를 셔츠 주머니에서 꺼내는 이미지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주머니에서 아이팟 나노를 꺼내던 충격과 맞먹을 만큼 놀라웠어요.
이후의 휴대전화는 극도로 작아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에는 반도체 기술도 있었지만 폼팩터,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접으면 크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지갑을 반으로 접는 것처럼 말이예요.
스타택 등장 이후 폴더폰은 빠르게 대중화됐고, 이후에는 ‘밀어 올리는 화면’이 시도됩니다. 일명 슬라이드 폰입니다. 국내에는 ‘스카이’가 가장 먼저 제품을 내놓았는데, 폴더 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었고, 키패드만 숨겨 둔 채 화면은 항상 볼 수 있는 실용성도 얻었지요. 대중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키패드가 옆으로 돌아서 나오는 휴대폰도 등장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휴대전화가 ‘화면’과 ‘키패드’라는 뚜렷한 요소로 만들어진 기기였기 때문입니다. 안테나와 칩셋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화면이 보이고, 키패드로 입력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등장 이후 키패드가 큼직한 화면 속으로 들어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시 휴대전화는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정보를 보는 것과 입력하는 쪽 모두 하나의 요소, 즉 ‘터치 디스플레이’가 처리했기 때문이지요. 물리적으로 접거나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묘하게도 큰 화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면서 십수년간 휴대폰 업계가 노력해 왔던 ‘소형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큰 화면과 작은 기기라는 딜레마를 풀어내는 방법은 ‘화면을 접는 것’이었고, 이는 한때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현실이 됐고, 갤럭시 폴드는 접는 화면을 쓴 여러 기기들 사이에서 시험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서 세 번째 제품에 내려진 숙제는 ‘대중화’에 있다고 짚었는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는 그 의미를 잘 짚어낸 듯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숨겨진 카메라 등이 훨씬 가다듬어졌고, 접고 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했던 부분들도 디자인으로 상당히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사이에 디스플레이나 힌지 등 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삼성전자가 알게 된 듯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갤럭시 Z 폴드3는 200만 원, 갤럭시 Z 플립3는 125만 원부터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싼 기기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Z 시리즈는 모두가 꼭 써야 하는 기기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소비층이 더 눈여겨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넘사벽’이 아니라 고민해볼 만한 선택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더 쉽게 손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마 당분간 갤럭시 Z 시리즈는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게 될 듯합니다.
물론 갤럭시 Z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싸지만 가격을 더 내리는 것보다 충분한 가격을 바탕으로 최신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플래그십’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과거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펜과 큰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목받고, 고급화와 플래그십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갤럭시 S 시리즈의 ‘슈퍼 노멀’과 갤럭시 Z의 실험적인 시도가 시장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접는 디스플레이가 더 저렴해지면 지금의 큰 화면과 펜처럼 대중화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 갤럭시 폴드의 가격대라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따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기로 여러 역할을 하는 기기도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이 성숙된 시장을 기술로 극복하고 안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About Author
최호섭
지하철을 오래 타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모바일 기기들이 평생 일이 된 IT 글쟁이입니다. 모든 기술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공부하면서 나누는 재미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