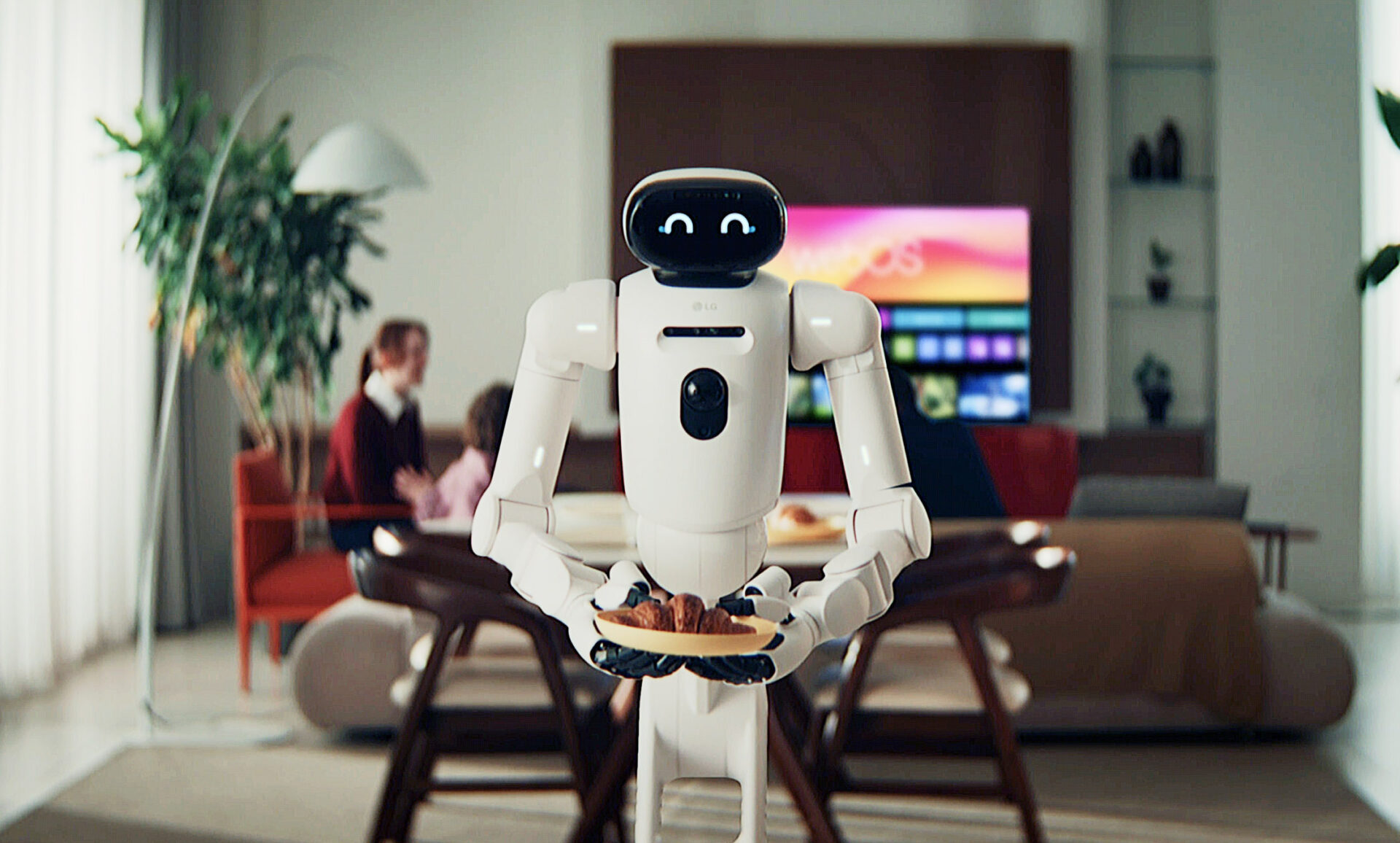안녕하세요. IT칼럼니스트 최호섭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제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카메라, 커피, 냉동 식품까지 여러가지 고민 끝에 선택한 것들이죠. 하지만 어떤 것이든 시간이 좀 지나면 손이 가는 물건은 결국 내게 맞는 한두 가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결국 그게 몇몇 브랜드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에디트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연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나를 스쳐간 브랜드의 역사’ 정도가 될까요.
첫 번째는 소니의 카메라입니다. 지난해 후지필름의 X-T30을 사면서 카메라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2020년에도 카메라를 두 대나 새로 들였습니다. 하나는 A7R3, 다른 하나는 A7C입니다.
 [어쩌다가 또 들인 카메라, A7C입니다]
[어쩌다가 또 들인 카메라, A7C입니다]
소니가 카메라를 만든 건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필름 카메라가 시장의 중심이던 1990년대 후반, 한 친구가 신기한 물건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카메라였어요. 200만 화소에 렌즈가 앞 뒤로 돌아가던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옮겨서 볼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해 봤을 때의 충격은 꽤 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태동 그리고 소니의 사이버샷
2000년 즈음 소니는 가장 잘 나가던 전자회사였습니다. 세상의 신기하고 놀라운 제품에는 SONY라는 네 글자가 박혀 있었고, 디지털카메라도 그 중 하나였죠. 지금도 신기한 카메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소니의 ‘마비카’ 시리즈 디지털카메라였는데, 이 시리즈는 3.5인치 디스켓, 혹은 미니 CD를 넣어 사진을 기록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마비카라는 이름도 Magnetic Video Camera를 줄인 건데, 마그넷, 그러니까 자성을 띈 기록 미디어를 쓰는 카메라라는 의미를 품고 있죠.
디스켓에 사진이라니 말도 안되는 일 같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샀던 게 2002년의 일이었는데 당시 16MB짜리 메모리를 10만 원도 더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스켓은 마치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는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사진을 곧바로 디스켓에 기록해 주기 때문에 컴퓨터에 꽂아서 사진을 볼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도 잘 살렸습니다.
 [마비카 FD5,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Wikipedia, Ashley Pomeroy)]
[마비카 FD5,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Wikipedia, Ashley Pomeroy)]
2000년이 넘어가면서 디지털카메라는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사진이 일상이 됐습니다. 가방 속에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하나씩은 넣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이 됐죠. 소니는 캐논, 니콘, 올림푸스 등 전통의 카메라 회사들과 출발은 달랐지만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제가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사이버샷 F-717이었습니다. 렌즈 경통이 큼직했고, 위 아래로 거의 180도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캐논이나 니콘이 기존 필름 카메라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점잖은’ 카메라를 만들고 있을 때 소니는 이렇게 ‘요란한’ 카메라를 잔뜩 내놓고 있었죠.
 [소니의 디지털카메라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필름 카메라에 대한 빚이 없기 때문이죠.(출처 : Wikipedia, Thegreenj)]
[소니의 디지털카메라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필름 카메라에 대한 빚이 없기 때문이죠.(출처 : Wikipedia, Thegreenj)]
그리고 소니 특유의 과장되고 화사한 색깔은 호불호가 있기는 했지만 사진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디지털카메라를 샀다 팔았다를 되풀이 했는데 이 F-717은 제가 캐논의 DSLR 카메라를 사기 전까지 3년 넘게 많은 사진을 담아주었습니다.
DSLR의 시대. 소니, 미놀타를 삼키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카메라 시장은 빠르게 DSLR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APS-C, 이른바 ‘크롭 센서’를 넣은 디지털카메라는 전국민을 사진 작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척척 렌즈를 갈아 끼우면서 뒷 배경이 휙 날아가는 사진을 찍는 게 멋이던 시절입니다. 소니는 관심사에서 급격히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 행복은 센서 크기 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 어느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한 겁니다. 미놀타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테고, 복사기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미놀타는 광학 기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카메라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인 ‘알파 마운트’를 소니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DSLR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소니와 전문가용 카메라는 잘 연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소니 알파100, 미놀타의 다이낙스5D의 개선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DSLR 시장 진출, 그리고 미놀타의 인수는 지금 돌아보면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한 일이라는 거죠. (출처 : Wikipedia, Holger Fink)]
[소니 알파100, 미놀타의 다이낙스5D의 개선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DSLR 시장 진출, 그리고 미놀타의 인수는 지금 돌아보면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한 일이라는 거죠. (출처 : Wikipedia, Holger Fink)]
이후 소니는 ‘알파100’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DSLR 카메라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소니의 색깔보다는 미놀타의 유산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카메라의 핵심인 렌즈와 센서, 즉 광학계가 미놀타의 것이었고, 아무리 소니라고 해도 처음부터 기본 구조를 바꿔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전통적인 형태의 DSLR 카메라 인기가 높기도 했었고요. 소니의 DSLR 카메라는 한 마디로 엄청나게 새롭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차분히 기본기를 다져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소니였습니다. 2010년 소니의 디지털카메라는 두 가지 변신을 합니다. DSLR 카메라를 DSLT로 전환하고, APS-C 센서의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를 내놓는 것이었죠. 이 두 제품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마디로 디지털 카메라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카메라의 형태는 기존 필름 카메라의 구조와 디자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두 변화는 지금 소니 디지털카메라의 뼈대가 됩니다.
진짜 디지털을 꿈꾸다
두 가지 변화 중 첫번째는 뷰파인더였습니다. A55, A99 등으로 익숙한 DLST는 오각 미러, 프리즘 등으로 혁신을 가져왔던 과거의 SLR 카메라를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DSLR 카메라의 미러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뷰파인더로 보내주고, 초점을 맞추는 등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미러를 치워야 빛이 센서로 갈 수 있었지요. DSLR 카메라의 시원스런 ‘찰칵찰칵’ 소리가 바로 이 미러를 들어올릴 때 나는 기계적 소음이지요. 그런데 소니는 DSLT 카메라에 ‘펠리클 미러’를 넣어서 빛의 대부분을 통과시키고 일부는 기존처럼 반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이유는 초점 때문인데, 당시로서는 위상차 방식의 초점 방식이 가장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빛의 일부를 반사시켰습니다. 대신 뷰파인더로 들어오는 정보는 미러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익숙한 전자식 뷰파인더를 적용했죠.
 [소니 알파99II, DSLT는 미러리스와 DSLR의 접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99II, DSLT는 미러리스와 DSLR의 접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복잡한데, 한마디로 미러를 들어올리지 않아도 되는 DSLR 카메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DSLR 카메라에 미러리스 기술을 넣었다고 할 수 있지요. 당시에는 ‘DSLR 카메라를 잘 모르는 소니가 이상한 걸 만들었다’는 평가부터 ‘빛의 일부를 반사시키는 과정에서 밝기에 손해를 본다’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지적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카메라는 A99II까지 오면서 꽤 성공한 방식이 됐습니다. 지금은 자취를 감추긴 했지만 이는 DSLT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커다란 DSLR 카메라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소니는 여기에서 쌓은 기술을 모두 미러리스로 옮기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소니 NEX-5는 미러를 빼고,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휴대성과 DSLR 카메라의 판형을 얻어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소니 NEX-5는 미러를 빼고,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휴대성과 DSLR 카메라의 판형을 얻어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2010년의 두 번째, 더 큰 변화는 미러리스입니다. 소니는 NEX라는 브랜드로 미러리스 카메라를 내놨는데, 카메라는 똑딱이 콤팩트 카메라처럼 작지만 그 안의 센서는 APS-C, 그러니까 DSLR 카메라와 똑같았지요. 렌즈도 바꿔 꽂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러와 함께 뷰파인더를 아예 떼어냈습니다. 콤팩트 카메라의 휴대성과 DSLR 카메라의 화질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게 바로 E마운트의 출발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센서 크기만 같을 뿐 DSLR 카메라보다 화질도 기기적인 성능도 떨어진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 문제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이 E마운트는 지금 소니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미러리스는 단순히 크기를 줄였다고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소니는 DSLT와 미러리스를 내놓으면서 미놀타에 대한 연결 고리를 끊어냅니다. 미놀타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소니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고, 고정관념을 깨는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게임체인저 A7, 그 안에는 반도체 기술
어쨌든 2010년대 초반까지 소니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메이저로 꼽히기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캐논과 니콘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결국 ‘사진 좀 찍는다’면 이 두 브랜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꾸준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카메라에 접근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A7 시리즈입니다. 2013년, 소니는 ‘풀프레임 센서’와 ‘미러리스’라는 익숙한 두 단어를 붙인 낯선 제품을 내놓습니다. 마치 NEX가 콤팩트 카메라에 크롭 센서 DSLR 카메라를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35mm 풀 프레임 센서를 미러리스 카메라에 넣은 겁니다.
NEX와 마찬가지로 A7 역시 첫 제품은 여러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돌아보면 소니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일단 A7의 작은 크기에 풀프레임 센서를 넣는 것 자체가 디자인의 파격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크기를 줄이는 데에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센서 성능 뿐 아니라 이미지 처리까지 모두 반도체가 맡게 되는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마치 80년대 반도체를 기반으로 카세트의 크기를 파격적으로 줄였던 ‘워크맨’ 시리즈를 떠올리는 장면이지요.
소니 A7 시리즈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 크기와 바디 크기의 고정관념을 깼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 진화는 최근의 A7C까지 이어지고요.
소니는 센서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 동안 제일 안쪽에 묻혀 있던 포토다이오드를 앞으로 끌어내는 이면조사 방식 센서를 내놓기도 했고,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캡처하기 위해 센서 뒤에 메모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센서 기술들은 1인치 센서를 쓰는 콤팩트 카메라 RX100 시리즈를 통해 먼저 소개되고, 점차 APS-C 센서를 거쳐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면서 크기를 늘려가는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 전략 덕에 소니의 RX100 시리즈는 스마트폰에 자리를 잃었던 콤팩트 카메라 시장에서 꽤 탄탄한 입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소니는 이 A7의 센서 반도체를 여러가지로 바꾸어 다른 카메라 시장을 두드립니다. 바로 고해상도 모델인 A7R과 고감도, 동영상을 중심에 둔 A7S였습니다. 사실 소니는 카메라만큼이나 카메라 센서를 많이 파는 회사였고, 센서 기술도 최고로 꼽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A7에 넣은 것이지요. A7R은 3600만 화소로 고해상도에 대한 장벽을 깼습니다. 이후 4200만 화소를 거쳐 A7R4에 이르러서는 6100만 화소를 심었죠.
A7S는 1200만 화소 센서를 넣었지만 아주 높은 감도를 자랑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사진을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A7S는 뜻밖의 환경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동영상이지요. 사진만큼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이즈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담아내는 특성을 가졌으니까요. 당시 대세였던 풀HD는 200만 화소고 4k도 이론적으로는 800만 화소면 됩니다. 1200만 화소면 충분했죠. 이 A7S 시리즈는 지금 A7S3를 통해 영상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카메라가 됐습니다.
 [결국 소니의 경쟁력은 센서 기술, 즉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소니의 경쟁력은 센서 기술, 즉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
소니, 디지털에서 출발한 카메라
소니는 필름 시절 카메라에 대한 빚이 없는 유일한 카메라 회사입니다. 미놀타 인수도 미놀타의 과거를 산 게 아니라 전문가용 카메라의 경험과 렌즈 마운트를 샀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지금 소니 카메라 그 어디에서도 미놀타를 비롯해 필름 카메라의 색깔을 찾을 수 없죠.
소니는 처음 카메라를 만들 때부터 디지털로 시작했고, 디지털이라는 특성을 살려 필름 카메라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필름이, 필름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유산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름, 그러니까 가로폭이 35mm인 3:2 비율의 빛을 받아들이는 판형이라는 필름, 그리고 사진의 본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었고, 현재도 소니의 카메라는 진화중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A7C 역시 기존 A7의 한계를 깨고 더 작은 바디에 풀 프레임 센서를 넣는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올 초 내놓았던 ZV-1은 RX100이라는 뼈대를 두고, 회전 디스플레이와 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스킨, 그리고 얼굴/제품 중심의 초점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1인 촬영용 카메라’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지요.
개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카메라’라는 생각으로 샀던 A7이 벌써 4대가 됐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저무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대중적인 시장의 폭발이 가라앉았을 뿐 여전히 그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이제까지는 그 답을 빨리 찾아 왔습니다. 필요도 없는 다음 카메라가 기다려지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About Author
최호섭
지하철을 오래 타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모바일 기기들이 평생 일이 된 IT 글쟁이입니다. 모든 기술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공부하면서 나누는 재미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어쩌다가 또 들인 카메라, A7C입니다]
[어쩌다가 또 들인 카메라, A7C입니다] [마비카 FD5,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Wikipedia, Ashley Pomeroy)]
[마비카 FD5,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Wikipedia, Ashley Pomeroy)] [소니의 디지털카메라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필름 카메라에 대한 빚이 없기 때문이죠.(출처 : Wikipedia, Thegreenj)]
[소니의 디지털카메라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필름 카메라에 대한 빚이 없기 때문이죠.(출처 : Wikipedia, Thegreenj)] [소니 알파100, 미놀타의 다이낙스5D의 개선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DSLR 시장 진출, 그리고 미놀타의 인수는 지금 돌아보면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한 일이라는 거죠. (출처 : Wikipedia, Holger Fink)]
[소니 알파100, 미놀타의 다이낙스5D의 개선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DSLR 시장 진출, 그리고 미놀타의 인수는 지금 돌아보면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한 일이라는 거죠. (출처 : Wikipedia, Holger Fink)] [소니 알파99II, DSLT는 미러리스와 DSLR의 접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99II, DSLT는 미러리스와 DSLR의 접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니 NEX-5는 미러를 빼고,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휴대성과 DSLR 카메라의 판형을 얻어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소니 NEX-5는 미러를 빼고,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휴대성과 DSLR 카메라의 판형을 얻어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결국 소니의 경쟁력은 센서 기술, 즉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소니의 경쟁력은 센서 기술, 즉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