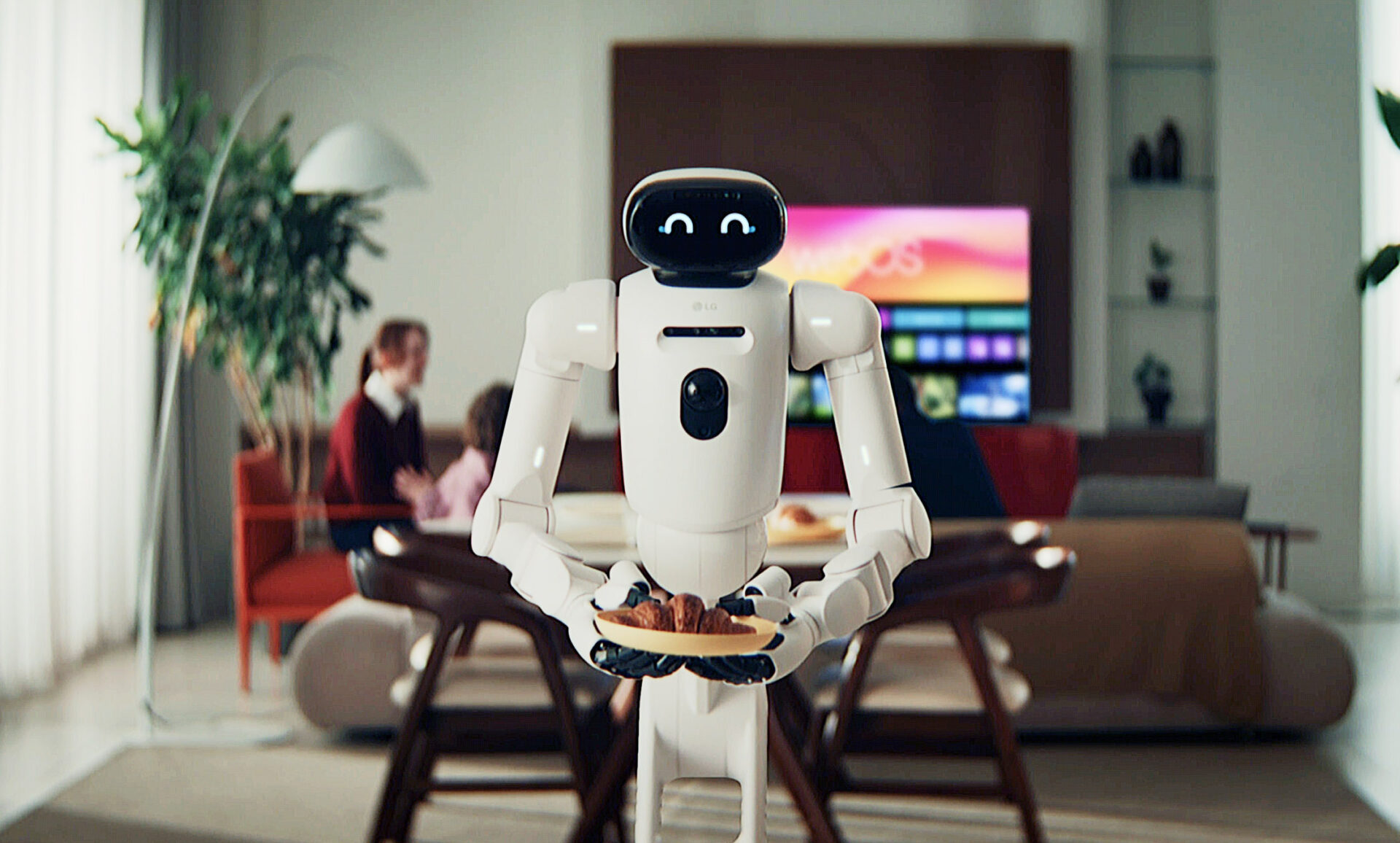안녕. 디에디트의 파고다 공원, 올드리뷰어, 리뷰계의 암모나이트, 여러분이 사지 않을 제품만 골라서 소개하는 객원필자 ‘기즈모‘다. 얼마 전에 에디터 H는 내 글을 보고 디에디트에 광고 의뢰를 하지 않을 제품만 골라서 소개한다고 한다고 했다(참고로 이 글이다). 맞는 말이다. 오늘도 신중히 전세계 수만 개 브랜드 중에서 디에디트에게 광고 의뢰를 하지 않을 주제를 골랐다. 꽤 힘들었지만 보람찬 과정이었다.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는 오디오 브랜드인 ‘테크닉스(Technics)’다. 처음 들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부럽다. 성공적인 삶이다. 하지만 요즘 힙한 LP에 관심 있고 힙합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테크닉스를 기억해야 한다. 테크닉스는 LP의 전성시대를 풍미했고 힙합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테크닉스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만든 서브 브랜드다. 아시다시피 파나소닉은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다. 1932년부터 온갖 가전 제품을 다 만들어 왔다. 그 중에서 오디오 사업 부분인 테크닉스는 1965년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피커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스피커보다 턴테이블로 성공했다. 그냥 성공도 아니다. 엄청난 성공이다. 이유는 뭘까? 내 생각으로는 테크닉스가 파나소닉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이다. 언뜻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다.
당시까지 유럽 오디오 회사들은 대부분 공예품을 만들듯 오디오를 만들어 왔다. 나무를 잘 가공해서 마치 바이올린을 만들듯이 스피커 통을 짜고 장인들로부터 내려오던 과거의 기술로 하나하나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해 수작업 생산을 주로 했다. 유럽 사람들은 뭘 만들면 항상 이렇게 만든다. 역사와 전통, 헤리티지 뭐 이런 것을 잔뜩 강조한다. 그래서 제품의 스펙보다는 감성을 먼저 보라고 호통친다. 우리가 감성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슬그머니 감성적인 가격을 붙여 놓고 자기들은 부자가 된다. 어쨌든 과거의 오디오는 과학보다는 도제식 기술의 반복에 가까웠고 따라서 엉성한 완성도에 고장이 잦았다. 그나마 물리적 움직임이 적은 스피커나 앰프는 고장이 적었지만 물리적으로 계속 회전하는 턴테이블은 고장이 잦았다. 고장이 나면 유럽 장인들은 왜 이렇게 험하게 썼냐며 호통치며 수리비를 비싸게 받아 먹곤 했다.
파나소닉 산하의 테크닉스는 대기업의 피가 흐르는 회사다. 고장 잘 나고 문제가 생기기 쉬운 턴테이블은 클레임을 터부시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기존 턴테이블은 모터를 돌리면 구동벨트를 통해 동력을 전달해 LP 베이스판을 돌리는 간접 구동방식을 썼다. 구동벨트는 잘 닳아서 끊어지기도 했고 느슨해지면 속도가 엉망이 되고 초기 시작도 느렸다. 테크닉스는 이 설계를 바꾸어 모터가 베이스 판을 직접 돌리는 세계 최초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개발했다. 정밀한 모터 제어기술 덕분이었다.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지루했을 거다. 이제 다 끝났다.

[테크닉스 SL-1200]
테크닉스는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해 1972년 테크닉스 SL-1200을 발매한다. 이 제품은 아무리 음악을 들어도 고장이 좀처럼 나지 않았고 주변에 큰 진동이 있어도 속도의 변화가 없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처음에는 제품 자체에 감성이 없어 별 반응이 없었다. 브랜드 이름도 너무 공돌이스러웠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이 테크닉스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클럽 DJ다. 테크닉스의 뛰어난 내구성과 완성도, 대기업다운 만듦새는 가혹한 상황에서 음악을 틀어야 하는 DJ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이었다. 유럽의 DJ들은 앞다투어 테크닉스 SL-1200을 선택했고 테크닉스의 턴테이블은 서서히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Saturday Night Fever, 1977]
그리고 1970년대 말 영화 ‘토요일밤의 열기(Saturday Night Fever)’로 인해 전세계에 디스코 붐이 일어난다. 때마침 테크닉스는 SL-1200의 후속작인 SL-1200 mk2를 발매한다.
이 모델은 엄청난 내구성과 뛰어난 신뢰성을 가진 괴물 같은 턴테이블이었다. 테크닉스는 이 모델로 턴테이블 업계를 평정한다. 돌이켜 보면 1970년대의 일본은 유럽에 실업자를 양산시키던 시대였다. 일본의 카시오, 세이코는 쿼츠시계를 개발하여 당시까지 전세계를 주름잡던 서유럽의 시계산업을 붕괴시켰다. 캐논, 니콘, 미놀타 등은 새로운 DSLR 기술을 개발해서 라이카를 비롯한 독일 카메라 회사들을 모두 도산시켰다. 일본은 유럽의 역사와 전통, 브랜드, 장인의 손재주, 품위, 감성 등등을 기술과 과학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 깔아 뭉갰다. 턴테이블은 테크닉스가 담당했다. 온갖 새로운 기술과 첨단 사양으로 중저가형 턴테이블 시장을 휩쓸었다. 유럽의 잘 나가던 턴테이블 회사들은 대부분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장인들에게는 불행이었지만 클럽 DJ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DJ들은 내구성이 좋고 회전속도가 정확한 테크닉스 턴테이블로 스크래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발견했다. 일반 턴테이블로는 클럽 DJ들의 가혹한 스크래칭을 버텨낼 수 없었다. 오직 테크닉스의 턴테이블만 가능했다. DJ들에게 테크닉스의 턴테이블은 필수요소였고 힙합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테크닉스는 DJ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SL-1200 Mk6까지 350만대 이상을 팔아 치우며 공전의 히트를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CD의 시대가 오며 턴테이블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다. 힙합 DJ들만의 수요로는 테크닉스라는 대기업이 유지될 수 없었다. 끝내 파나소닉은 2010년 테크닉스 브랜드의 단종을 선언한다.

전세계 DJ들은 엄청나게 당황했다. 오디오 테크니카나 데논을 비롯해 대안이 몇 개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손에 익어온 테크닉스를 잃는 것은 다이슨 대신 차이슨을 손에 쥐어 주는 행위였다. 불쌍한 DJ들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재고 확보에 서둘렀다. 재고가격이 치솟고 중고 가격도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몇 년이 더 흘러 끝내 재고마저 구할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다. 테크닉스를 기억하는 2만 7천명이 파나소닉에게 테크닉스 1200시리즈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서명을 했다. 단순히 한 제품의 부활을 위해 이런 청원이 생긴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기적이 생겼다. 갑자기 아날로그 바람이 불며 LP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턴테이블을 찾는 이들이 하나 둘 생겼다.

[SL-1200GR]
그러자 교활한 파나소닉은 2014년에 슬그머니 테크닉스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2017년 드디어 SL-1200의 최신작인 SL-1200G와 SL-1200GR을 발매하기에 이른다. 부자가 된 DJ들의 수준에 맞게 가격도 대폭 올린 것이 유일한 흠이다.
세상에는 수 많은 제품이 있고 이 제품들은 알게 모르게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초등학교 때 코닥 캠코더를 선물 받고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다. MITS가 개발한 앨테어 8800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박람회에서 우연히 본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 소프트를 창업한다. 마찬가지로 수 많은 DJ들에게 테크닉스는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기술의 축복이었다.
2003년 세계 DMC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DJ Dopey는 이렇게 말했다. “테크닉스 1200이 아니었다면 나는 DJ가 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About Author
기즈모
유튜브 '기즈모' 운영자. 오디오 애호가이자 테크 리뷰어. 15년간 리뷰를 하다보니 리뷰를 싫어하는 성격이 됐다. 빛, 물을 싫어하고 12시 이후에 음식을 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