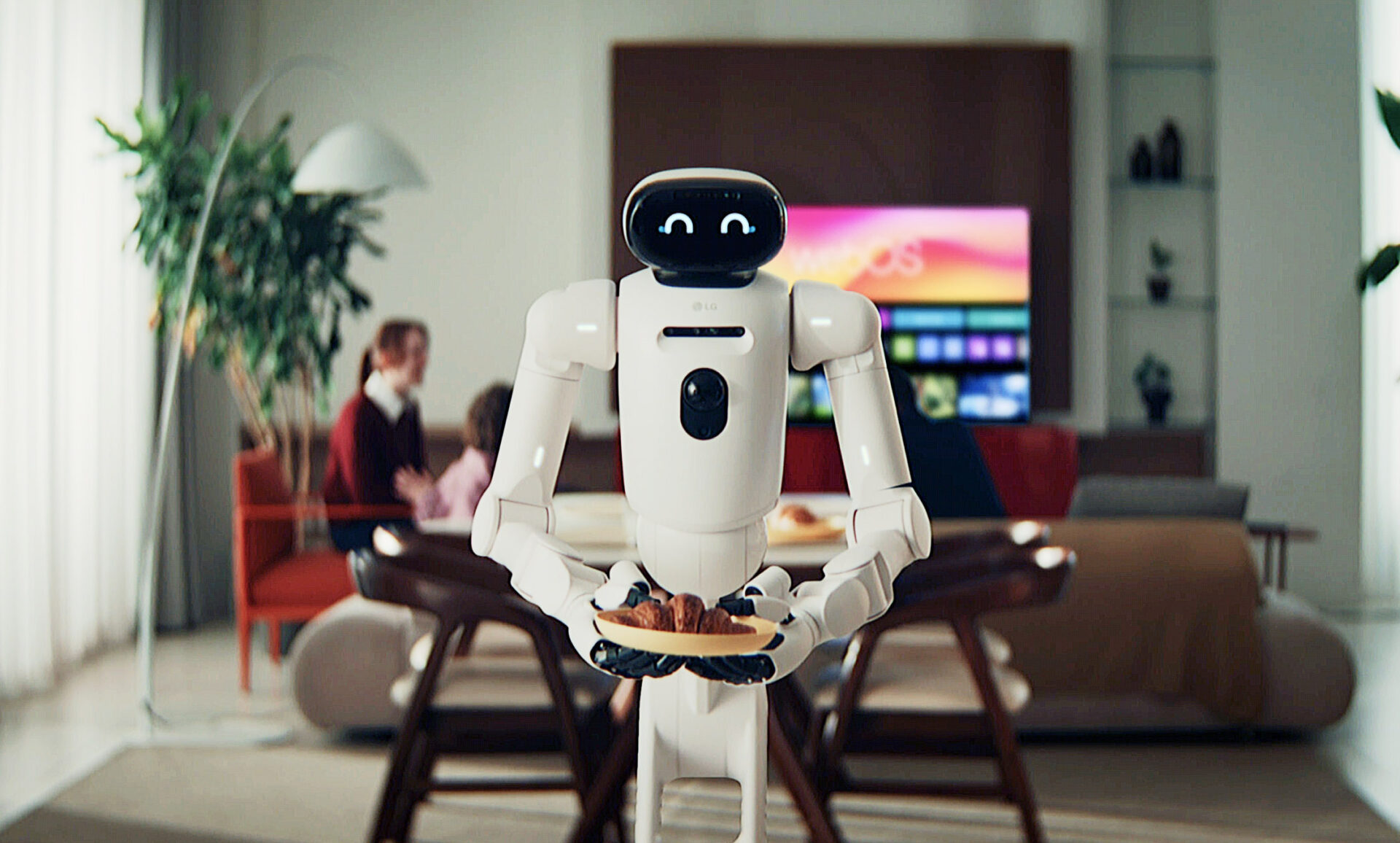누구나 유난히 집착하는 아이템이 있다. 예를 들면 향수를 모으는 사람, 지네처럼 신발장이 가득 찬 사람, 책장이 터져나갈 만큼 책이 많은 사람. 나의 경우는 가방에 유난한 애정을 보인다. 드레스룸이 가득 차게 모으는 수준은 아니지만, 가방을 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껴왔다. 비싼 가방이 아니더라도 만 원짜리 에코백을 살 때도 신이 났다. 새로운 가방을 들인다는 건 나의 가장 큰 유희였다. 그런데 요즘엔 이런 욕망이 시들해졌다. 왜냐면 어지간한 가방만큼 귀하고 비싼 몸을 매일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 바로 맥북. 정확히 말하면 맥북 프로다.
1.37kg의 맥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고 다니게 되면서 내 승부 가방(내 몸보다 아끼는 가방)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그분을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는 가볍고, 튼튼하며, 큼직한 가방이 최고다. 그렇다. 이것은 가방 리뷰인 척 시작했지만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의 리뷰이다.
2016년 12월부터 썼으니 벌써 한참 된 인연이다. 내가 쓰고 있는 모델은 SSD 512GB로 250만 원대. 내가 여태 써본 노트북 중 가장 비쌌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있었다. 그러니까 쓴지 14개월이나 된 물건을 다시 리뷰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겠지. 내가 리뷰를 할 땐 보통 이런 심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내가 이걸 사고 거지가 되었네.
나만 당할 수 없지. 여러분도 함께 거지가 되자.
이 글은 정확히 말하면 ‘터치바’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야 터치바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것들은 쓰는 순간 좋다는 걸 바로 알았지만 터치바는 그 진가를 아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터치바에 대한 첫 인상은 이랬다. 근사하고, 아름다운 최첨단 기술이지만 뭘 이렇게까지? 키보드로도 충분한 작업을 쓸데없이 고급스럽게 처리해놨달까. 아니나다를까, 터치바에 적응하는데는 꽤 시간이 필요했다. 터치바는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나 브라우저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얼굴로 변하며 “날 만져줘!”라고 외치는데, 아둔한 나는 이미 익숙해진 단축키를 누르느라 터치바를 어루만져주지 못한 것이다. 솔직히 터치바를 누르면 더 간편한 작업이지만, 익숙한 것 만큼 편한 건 없다. 눈이 터치바를 보기 전에 손이 먼저 반응해서 단축키를 눌러버렸다. 새로운 아이템에 익숙해진 내 손이 점점 터치바를 찾기 시작한 건 조금 나중 일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터치바의 마중’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터치바의 대응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파리 브라우저를 쓸 때 그렇고, 애플 자체 프로그램을 쓸 때 특히 그렇다. 터치바가 유용한 건 대략적으로 세 가지 순간이다.
첫째로 왼쪽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며 ‘정도’를 조절하는 조작. 대표적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하거나 볼륨을 조절하는 작업이 이에 속한다. 솔직히 이걸 제일 많이 쓴다. 터치바에 손을 올려놓고 부드럽게 왼쪽으로 밀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밀면 화면이 밝아진다. 아주 유아적인 인터페이스다. 쓸 땐 좋은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다. 무슨 소리냐고? 어느 날 간만에 터치바가 없는 맥북으로 작업을 하려는데, 화면이나 볼륨 조작을 위해 버튼을 ‘두다다다’ 몇 번이고 눌러야 하는 게 경박스럽게 느껴지더라.
버튼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슬리게 느껴졌다. 터치바는 이런 존재다. 무조건 더 편하기보다는, 보다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을 준다. 매끄럽게 코팅된 OLED 터치바 위로 손가락을 우아하게 굴리는 모습을 보라. 이건 사치스러운 옵션에 가깝다. 항상 이코노미 클래스의 비행기만 타다가, 우연한 항공사 업그레이드로 비즈니스석에 연달아 탑승했던 일이 있다. 그 뒤에 이코노미를 다시 탔더니 얼마나 비좁게 느껴지던지. 터치바 역시 그렇다. 있을 땐 좀 더 쾌적한 수준이지만, 적응한 뒤에 터치바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옹졸한 나란 인간.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 특히 단순노동(?)에 유리하다. 내가 맥북으로 돌리는 가장 무거운 작업은 당연히 영상 편집인데, 파이널컷 프로 X와 터치바의 조합은 상상 그 이상이다. 컷 분할이나 트림을 터치바에 있는 단축키로 조작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작업 능률이 두 세배는 올라간다.
셋째는 전체 화면으로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화면을 가리지 않고도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쓰다 전화가 오면 터치바에 뜨는 착신 버튼을 터치해서 전화를 받고, 퀵 타임 플레이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놨을 땐 터치바에서 타임라인을 훑어볼 수 있다. 여기서 터치바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터치바는 키보드의 연장일까, 디스플레이의 연장일까? 나의 경험으론 후자에 가깝다. 일단 키보드는 ‘눈으로 보지 않고 쓰는’ 경험이 강하게 작용한다. 독수리 타법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키보드를 타이핑한다. 근데 터치바는 납작한 가상 버튼을 만들어준다. 손에 눌리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키를 누르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시선을 옮겨서 터치바를 한번 보며 확인해야 한다. 키보드를 쓰는 감각이 터치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다. 오히려 디스플레이의 확장에 가깝다. 화면 일부만 터치할 수 있게 된 ‘보너스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긴 글로 터치바를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터치바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값비싼 사치품에 가깝다. 당장 이 맥북 프로에서 터치바를 뺀다고 해도 여전히 좋은 기기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선택의 문제다.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으니 계속 쓰겠다. 흑흑.
물론 단점도 있다. 이건 터치바의 문제라기보다는 OS의 불안정함에 대한 볼멘소리인데, 이따금 터치바가 달아오르며 먹통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땐 재부팅 밖엔 답이 없다.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나열하겠다. 터치 ID를 품은 전원 버튼은 최고다. 여태까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모든 맥북에 도입이 시급하다.

[아이폰을 나란히 두면 트랙패드가 얼마나 큰지 보인다]
대왕 트랙패드도 정말 좋다. 트랙패드가 넓으면 작업이 훨씬 쾌적하다.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타이핑할 때 팜 리젝션도 완벽하다. 스피커!! 스피커도 너무 좋다. 성능도 최고다.
그리고 가끔은 새로 산 5K 아이맥보다 맥북 프로가 잘 돌아간다고 느낄 때가 있다. 퓨전 드라이브와 SSD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휴대용 PC가 줄 수 있는 작업환경으로서는 정말 감사할 정도다.

[살짝 움푹 패인 형태의 키캡]
키보드는 현재 맥북 라인업에서는 가장 좋다고 평가하겠다. 구형 맥북 에어나 예전 맥북 프로 만큼 충분히 눌리진 않지만, 맥북처럼 야트막하진 않다. 충분한 타건감을 주면서도 소란스럽지 않은 타입이다. 예전에는 약간 물렁하게(혹은 푹신하게) 눌리는 키보드를 선호했는데, 이 제품에 적응한 뒤에는 단단하게 눌리는 키감에 안정감을 느낀다.

[가뿐해 보이지만 무거웠다]
이제 안 좋은 걸 말할 차례겠다. 무겁다. 13인치대 노트북이 1.37kg이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라고? 그건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던 14개월 전에나 먹히던 얘기다. 그동안 리뷰 때문에 다른 윈도우 노트북을 많이 써봤다. 사양도 뛰어나면서 깃털처럼 가벼운 노트북도 많더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램같은 것들. 그 제품의 가벼움을 맛보다 보면 1.37kg은 갑자기 벽돌 세 개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매일 들고 다니면서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배터리다. 이전에 12인치 맥북을 쓰다 맥북 프로를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더 쾌적해졌다. 다만 딱 두 가지가 아쉬웠다. 무겁고, 짧아졌다는 것. 안 그래도 무거운데 어댑터를 챙겨 다니기란 힘든 일이다. 난 크롬 브라우저를 30개씩 열어두고, 뻑하면 영상을 렌더링하고, 포토샵도 하루 종일 수시로 사용한다. 내 작업 환경이 거칠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맥북 프로의 사용 시간은 아쉽다.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마지막은 USB-C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시작된 ‘동글(dongle) 라이프’다.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서 SD 카드만 쏙 빼서 내미는 사람이 있다. 내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D 리더와 USB-A 변환 어댑터를 같이 내밀어야 작업이 이루어진다. HDMI 연결은 말할 것도 없고, 이어폰 잭이 남아있는 게 고마울 정도로 확장성에 야박한 제품이 됐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USB-C 포트가 완벽한 대세가 되면 지금의 불편함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적응은 했지만, 편하다곤 못하겠다. 흑흑. 그나마 C포트라도 4개 있으니 망정이지…
이 리뷰에서 결론을 내는 건 참 어렵다.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하기엔 너무 좋고, 무조건 사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민하고 계셨다면 그냥 들어오시라는 것. 적응한 뒤에는 사치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About Author
하경화
에디터H. 10년차 테크 리뷰어. 시간이 나면 돈을 쓰거나 글을 씁니다.